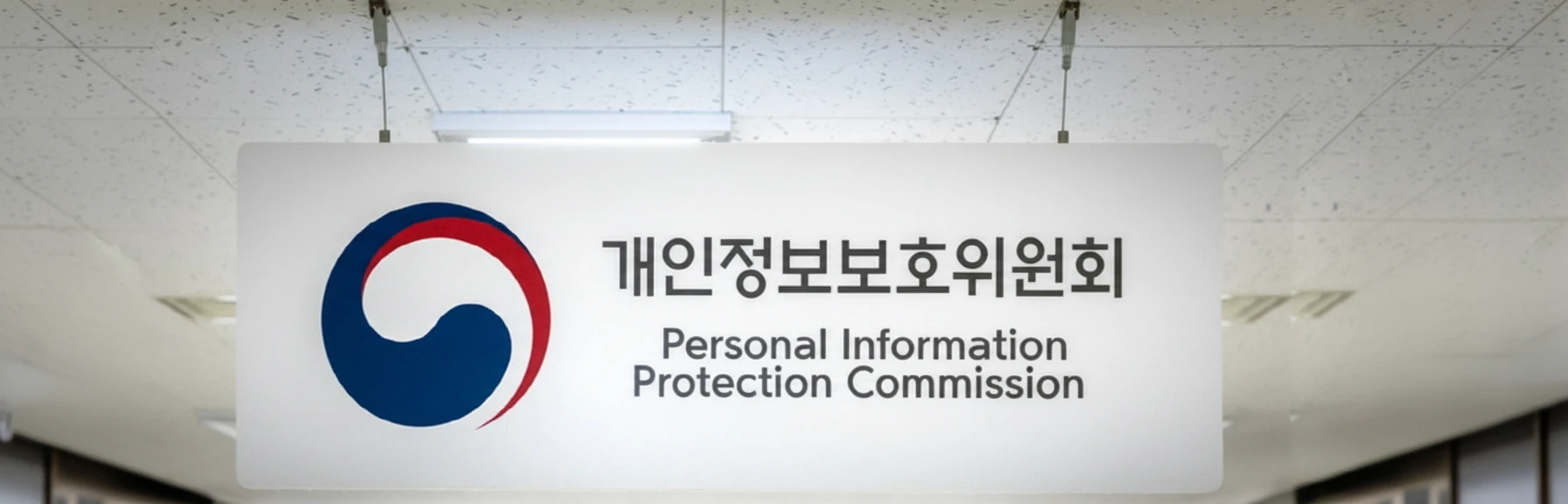17년 만에 부활하는 과학기술부총리제를 둘러싸고 전문가들이 단순한 연구개발(R&D) 조정 기능을 넘어 국가 혁신 체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계는 부처별로 분산된 R&D 자원을 통합 조율하고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거버넌스로 작동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공학한림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23일 서울 과학기술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기술선도 성장을 위한 역할과 과제' 포럼에서 학계·연구계·산업계 전문가들은 과기부총리제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안준모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재는 기술패권이 아닌 기술주권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R&D는 성장 수단을 넘어 국가 안보와 협상력의 핵심 자산"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화웨이의 R&D 투자 사례를 들며 "R&D는 핵심 역량 구축, 외부 지식 흡수, 전략적 협상력 강화라는 다층적 기능을 갖는다"며 "과기부총리제는 이러한 특성을 통합하는 오케스트레이션 기구로 기능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찬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혁신 자원의 통합 조정 기능을 강조했다. 그는 "과학기술혁신정책은 협력 횟수가 아니라 방향성과 강도가 핵심인 시대"라며 "부총리는 국가 R&D 예산, 인력, 전략기술을 포괄하는 총괄 조정자로서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R&D 예산의 급격한 변동과 관련해 "예산의 안정성과 전략적 재배치가 필수적"이라며 "R&D 예타제도와 연구과제중심 운영제도 개편 등 구조적 과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수경 KAIST 기계공학과 교수는 부처 간 장벽을 허무는 협력 문화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30조원 R&D 재정만으로는 글로벌 격차를 극복하기 어렵다"며 위기감을 표했다. 이어 "과기부총리제는 실질적으로 '혁신부총리제'로 인식돼야 한다"며 "부처별로 분할된 R&D와 정책 도구를 단일 매트릭스로 통합 조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처 간 협력은 제도 개편만으로 달성되지 않는다. 이번 정부에서 '부처 간 협력 문화가 개선됐다'는 평가만 받아도 의미있는 성과"라며 "부총리 임기 내 성과는 논문·특허 같은 정량 지표가 아니라 협력 문화와 거버넌스 전환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참여정부 시절 과기부총리 정책보좌관을 역임한 권재철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연구위원은 "당시 관계장관회의가 시간이 지나며 유명무실해진 것은 실질적 권한 부족 때문"이라며 "재정당국을 거치지 않는 패스트트랙이나 기술 변화 대응을 위한 예비비 성격의 예산 편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이번이 과기부총리 2회차인 만큼 과거보다 향상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과기부총리를 뒷받침하는 운영 체계가 필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R&D 예산의 5% 정도를 부총리 전용 예산으로 배정해 부처 간 협력을 유도하고 조정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찬수 부원장은 "과학기술 인재 육성은 법무부·산업부·외교부 등 다수 부처와 연관되어 있다"며 "해외 인재 유치와 정착 지원 같은 전략을 국가 차원에서 부총리가 총괄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R&D 예산 심의가 정치적 변동에 휘둘리지 않도록 과학기술 전담 상임위를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대규모 정부 R&D 사업은 논문·특허 성과보다 사회적 파급효과로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는 유상임 전 과기정통부 장관도 참석해 "AI 대전환기를 맞아 과학기술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가운데 컨트롤타워 역할의 과학기술부총리가 필요하다"며 "부처 간 소통이 어려운 현실에서 부총리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으며, 글로벌 협력을 위한 과학기술 외교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