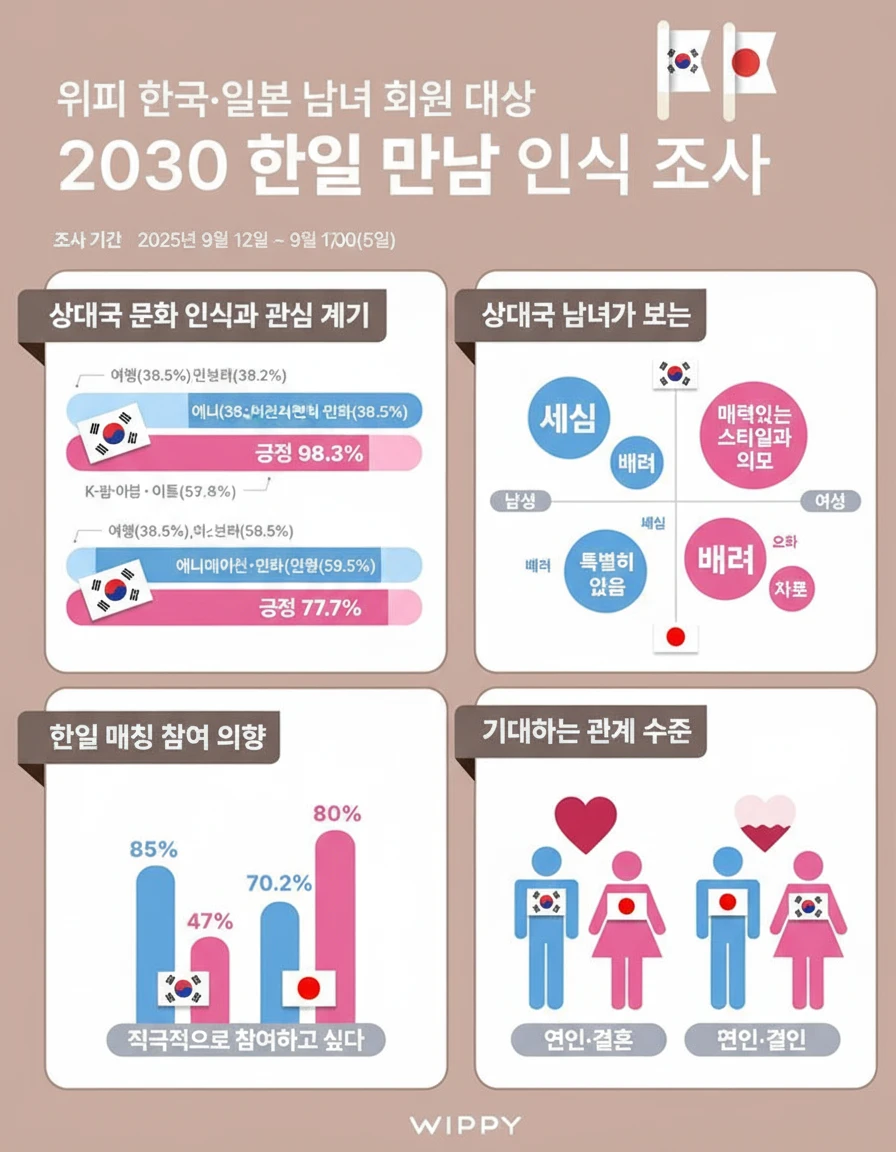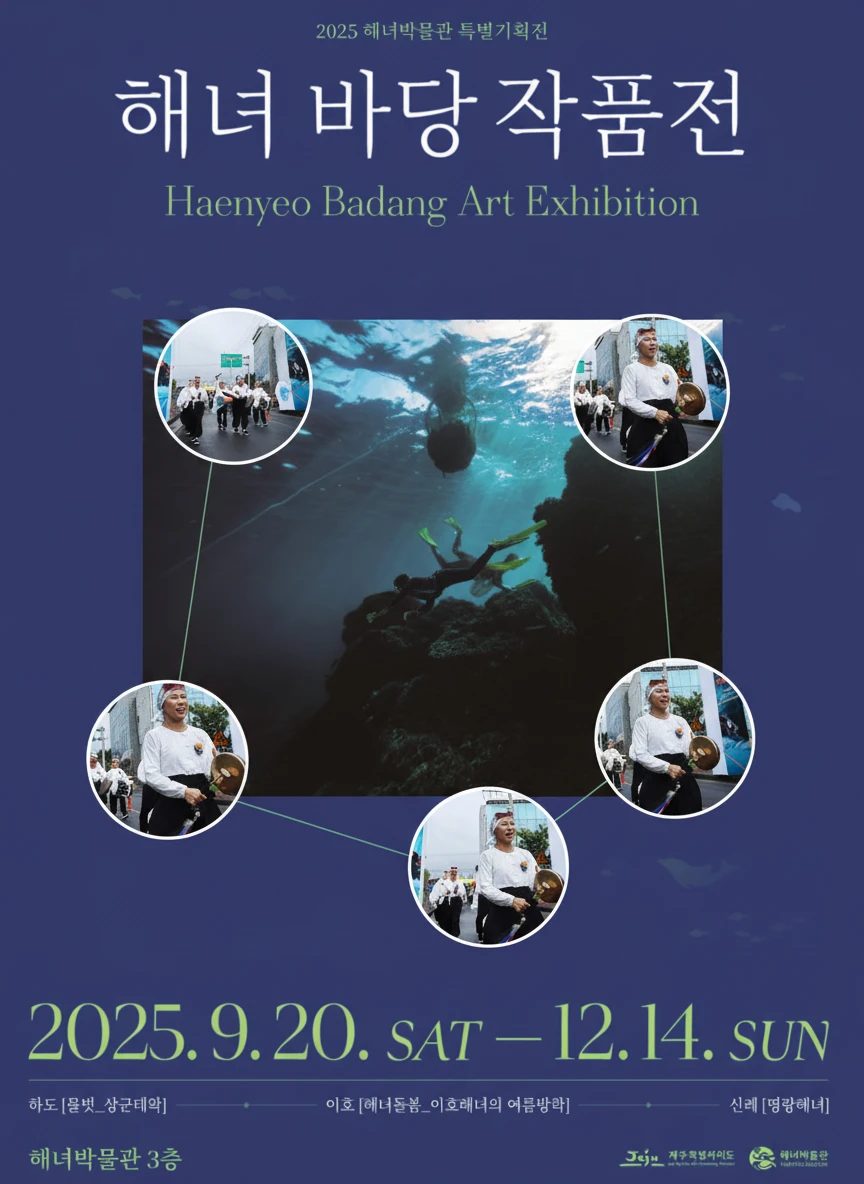
척박한 바닷속에서 대를 이어 살아온 제주 해녀들의 험난한 삶이 유전자 속에 각인돼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동시에 이들의 예술 혼도 작품으로 피어나며 새로운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 유타대 의대 멜리사 일라르도 교수팀이 국제학술지 '셀 리포트'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제주 해녀들의 몸에는 혹독한 물질 환경에 적응해온 진화의 흔적이 남아있다. 티베트 고산지대 주민들이 저산소 환경에 맞는 돌연변이를 얻었듯, 제주 해녀들도 찬 바닷물에서의 잠수에 특화된 생리적 변화를 보인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제주 해녀 30명과 해녀가 아닌 제주 여성 30명, 서울 여성 31명을 대상으로 비교 분석했다. 하도 지역에서 최소 3대 이상 물질을 해온 평균 65세 해녀들을 선별해 유전적 특성을 살폈다.
분석 결과 해녀들은 잠수 시 심박수 감소폭이 더 컸다. 10도 찬물에 얼굴을 담근 실험에서 해녀의 평균 심박수는 분당 18.8회 줄어든 반면, 일반 제주 여성은 12.6회 감소에 그쳤다. 이는 산소 소비를 줄이기 위한 신체 적응으로 해석된다.
더 주목할 점은 유전자 수준의 변화다. 제주도민들에게서 발견된 'rs66930627' 변이는 이완기 혈압을 낮추는 기능을 한다. 연구팀은 이를 이중 자연선택의 결과로 봤다. 물질에 유리하도록 혈압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진화했지만, 임신 중 해녀들의 안전을 위해 혈압을 다시 낮추는 유전자가 동시에 발달했다는 설명이다.
제주도민 33%에서 이 변이가 나타나는 반면 한반도 본토에서는 7%에 불과했다. 제주가 약 5000-7000년 전부터 본토와 유전적으로 분화되면서 독특한 환경 적응이 일어났음을 시사한다.
이주영 서울대 의류학과 교수는 "청소년기 이전부터 물질을 시작한 해녀들이 갖는 특성이 훨씬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런 해녀들이 앞으로 5년 내 모두 은퇴할 것"이라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연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일 개막한 제18회 제주해녀축제에서는 해녀들의 예술적 재능도 조명받았다. 해녀박물관에서 12월 14일까지 열리는 '해녀 바당 작품전'에는 이호·하도·신례 어촌계 해녀들이 직접 창작한 회화, 공예, 문학 작품들이 전시된다.
'해녀돌봄-이호해녀의 여름방학'에서는 젊은 해녀와 고령 해녀가 함께 그린 그림들을 선보인다. 물질을 멈춘 바다를 휴식과 치유의 공간으로 그려낸 작품들이다. '물벗-상군테왁'은 하도 해녀들이 손으로 엮어낸 테왁망사리 공예품으로, 오랜 동료애를 형상화했다.
'숨비소리, 위대한 해녀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한 이번 축제에는 제주 해녀 500여 명과 전국 해녀 50여 명이 참가했다. 다큐멘터리 촬영으로 해녀 체험을 한 배우 송지효도 토크쇼에서 "한 달 해녀 경험을 통해 이들의 말 '저승에서 벌어서 이승에서 쓴다'는 표현이 얼마나 절절한지 깨달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나 해녀 수는 급격히 줄고 있다. 제주시 현역 해녀는 2022년 1954명에서 지난해 1527명으로 21.8% 감소했다. 신규 해녀는 연간 20여 명에 그치는 반면 은퇴자는 150여 명에 달한다. 현역 해녀의 절반 이상이 70대 이상이며, 50대 이하는 10%에 불과하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자 세계중요농업유산인 해녀문화의 지속가능한 전승을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바다에서 길어올린 해녀들의 삶은 이제 과학적 연구 가치와 문화적 유산으로서 새롭게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