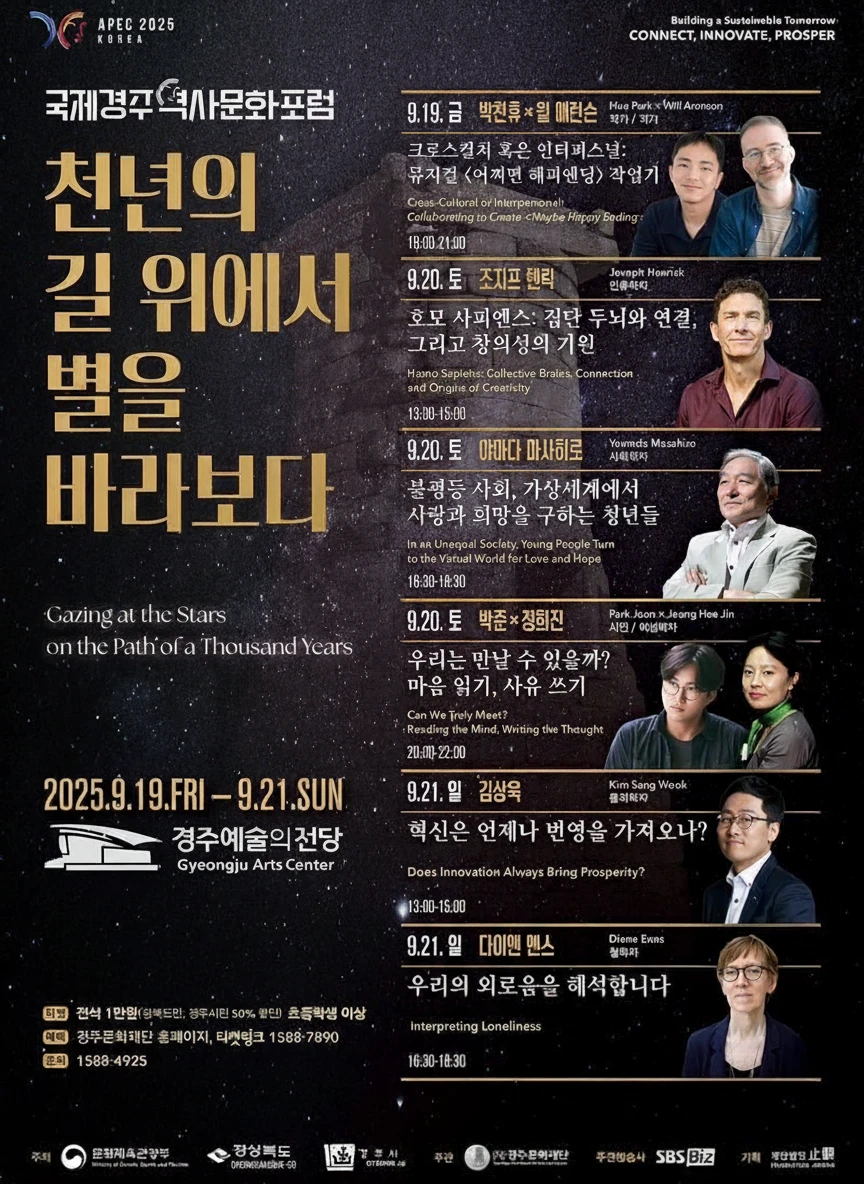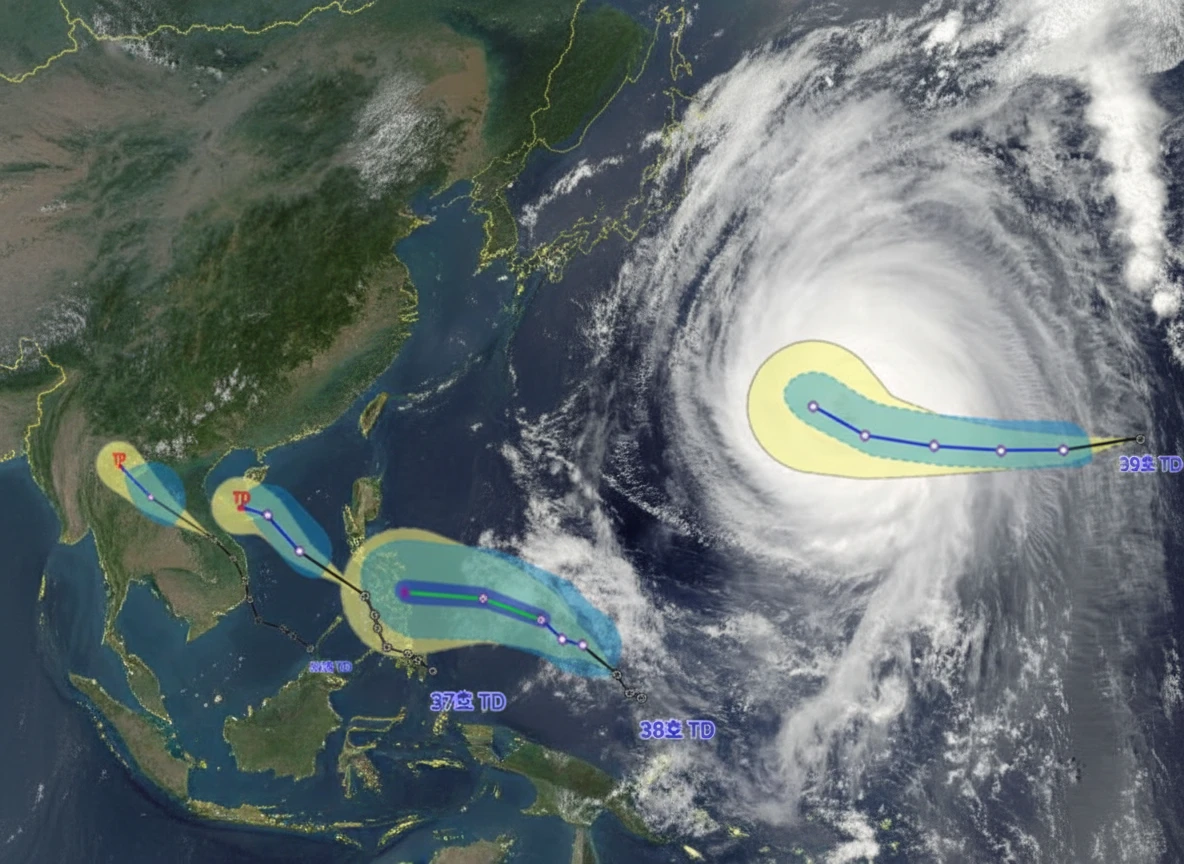전 세계 주요 도시들에서 주택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주거 위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지난 10년간 5억원대에서 10억원을 넘어서며 두 배 가량 뛰었고, 평균 매매가격은 같은 기간 5억원대에서 14억원대로 3배에 달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런던, 시드니, 밴쿠버, 샌프란시스코 등 세계 주요 도시의 중위 부동산 가격은 중위 가계소득의 7배를 웃도는 수준까지 올랐다. 일반적으로 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3배 이내일 때 구매 가능한 범위로 여겨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히 충격적인 수치다.
특히 자산 형성 기간이 짧은 밀레니얼 세대가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영국의 경우 1996년 25-35세 중간소득 계층의 3분의 2가 자택을 보유했으나 2016년에는 이 비율이 4분의 1까지 급락했다. 미국 역시 같은 연령대의 주택 보유율이 2004년 45%에서 2016년 35%로 감소했다.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도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1960-70년대 영국 세입자들은 수입의 10% 정도를 주거비로 지출했지만 2016년에는 36%까지 증가했다.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의 임대료는 2000년 중위소득의 25% 수준에서 2016년 각각 42%, 46%로 상승했다.
주택시장 연구 전문가인 조시 라이언 콜린스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 경제학 교수는 신간 '상품이 되어버린 우리들의 집, 값에 대하여'를 통해 이 같은 부동산 가격 급등의 핵심 요인으로 금융기관의 모기지론 확대를 지목한다.
교수는 지난 20년간 전세계적인 금융규제 완화로 인해 금융시스템과 부동산 시장 간 상호 증폭하는 순환 메커니즘이 구축되었다고 분석한다. 금융회사들이 부동산담보대출을 확대하면 주택 가격이 오르고, 이는 다시 더 많은 대출 수요를 불러일으켜 가격을 재차 끌어올리는 패턴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선진국들의 모기지론 규모는 최근 20년간 GDP의 40%에서 70% 수준으로 급증한 반면, 기업 대출 등 비주택담보 대출은 5% 정도의 미미한 증가에 그쳤다. 같은 기간 평균 실질 주택가격 역시 50% 가량 상승하며 담보대출 증가 추세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015년 7월 372조원에서 올해 7월 759조원으로 배 이상 늘어났다.
저자는 많은 자본주의 국가들이 자가주택 보유를 장려하면서 금융이 부동산에 '의존'하게 되었다며, 주거 문제를 현대 자본주의 위기의 핵심으로 규정한다. 그는 주택시장과 금융 체계에 대한 규제를 비롯해 경제 및 공공정책 전반의 대폭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해결방안으로는 무엇보다 모기지론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생산성 높은 산업 부문으로의 자본 투자를 위해 국영 투자은행과 이해관계자 은행의 신설이나 확장을 제안한다.
아울러 정부나 공공기관의 토지시장 개입 확대, 근로소득세 인하와 토지보유세 강화를 통한 조세정책 전환 등도 필요하다고 본다.
저자는 "정치 리더들이 용기를 내어 기존 세력에 맞서 주택이 금융상품이 아닌 본연의 목적인 '거주 공간'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주택을 재산 증식 도구로 바라보는 관점을 버리고, 모든 이가 안전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새로운 담론을 정립해야 한다"고 역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