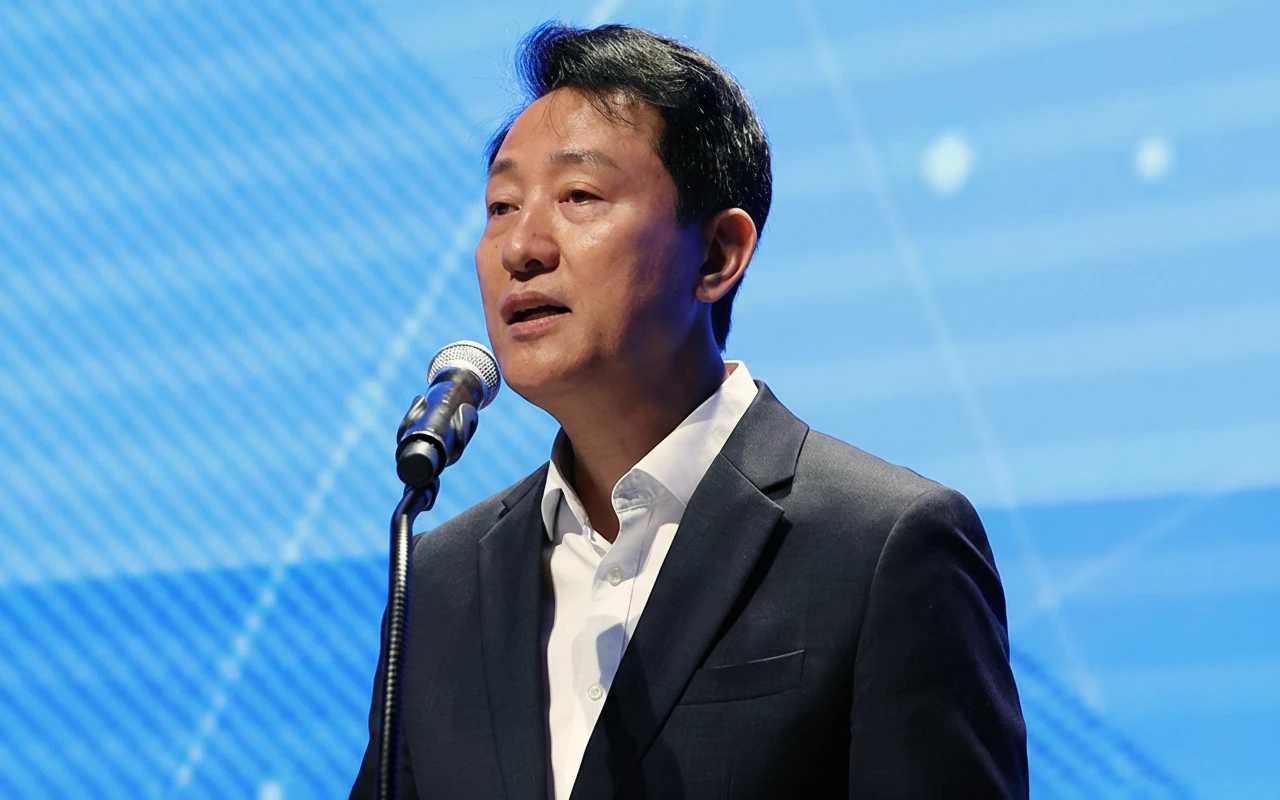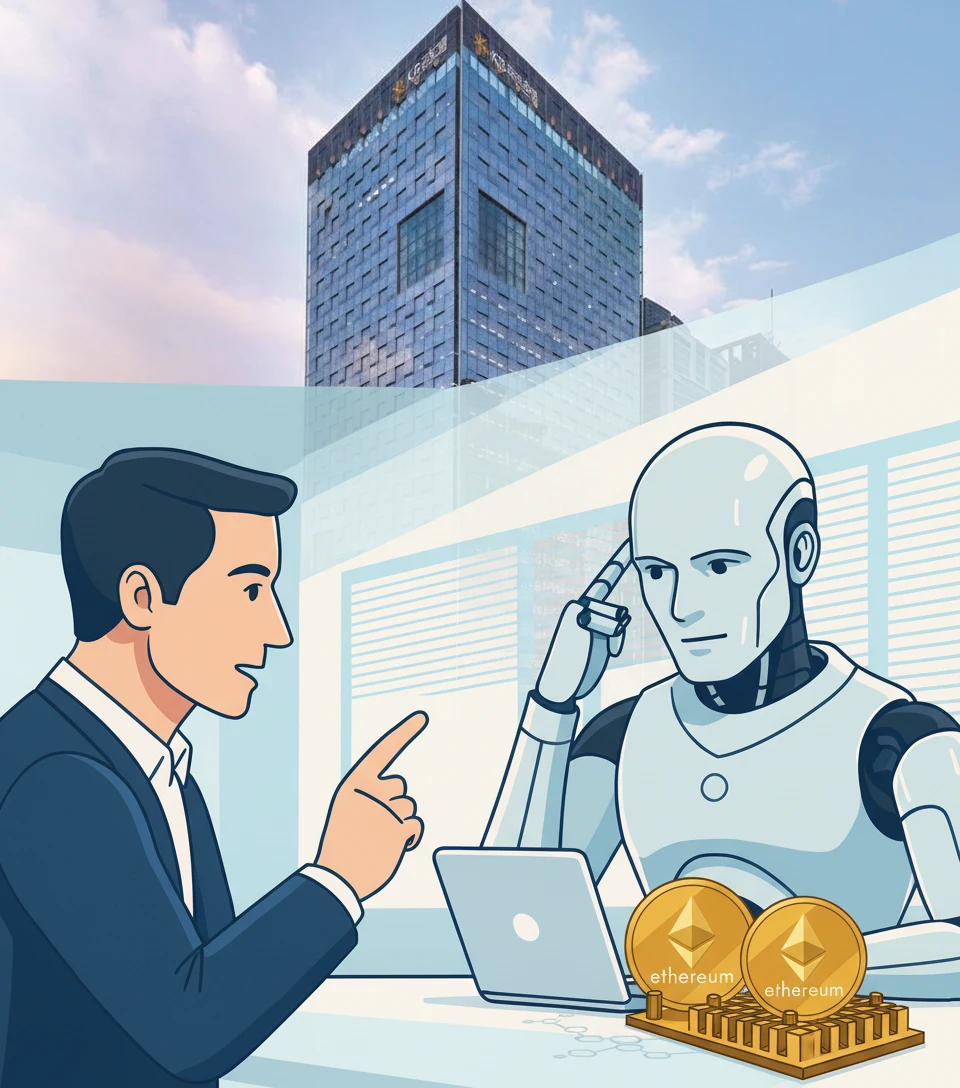배우자 사망 후 연금 수급자들이 재혼을 포기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유족급여를 받기 위해 새로운 결혼생활을 체념해야 하는 모순적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청년 연금정책을 둘러싼 찬반 의견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남편을 잃은 김영희씨는 10여 년간 월 30만원의 유족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해왔다. 새로운 반려자 B씨를 만났지만 혼인신고는 엄두도 내지 못했다. 재혼하는 순간 연금이 중단되고 지금까지 받은 급여마저 일부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 연금법들은 배우자의 재혼 시 수급권을 소멸시키며, 사실혼 관계도 재혼으로 간주해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국민연금뿐 아니라 공무원·군인·교직원 연금, 산재보험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2022년 헌법재판소는 5대 4 판정으로 이런 조항들을 합헌으로 결정했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찬성 측은 한정된 재원과 새로운 부양관계 형성을 이유로 들었고, 반대 측은 혼인 기간 중 연금 형성 기여도와 개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박탈을 문제 삼았다.
한편 정부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고3 국민연금 자동가입제도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만 18세 청년들을 자동으로 연금에 가입시켜 국가가 초기 보험료를 대납하는 이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다. 대상자는 45만여 명으로 예상되며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미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월 9만원씩 20년 납부 시 41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어 18만원을 10년 낸 경우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점이 제도의 강점으로 꼽힌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증가하는 연금 특성상 조기 가입의 이점은 분명하다. 또한 18세부터 장애나 유족급여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추후납부제도를 적극 활용할 경우 개인에게는 이득이지만 연금기금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방식의 연금 운용이 미래 수급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 은퇴와 함께 노후 준비 패턴도 변화하고 있다. 연금과 재취업을 병행하는 '연금겸업', 부부가 각각 연금을 받는 '연금 맞벌이'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부부 노령연금 수급자는 2019년 35만5천 쌍에서 2024년 78만3천 쌍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자녀와의 노후 계획 공유, 치매 대비 사전 준비, 건강보험료 등 비소비성 지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연금저축이나 개인형퇴직연금의 연금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 세금 설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연금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만큼, 개인의 생활 선택권과 제도적 안정성을 균형 있게 고려한 정책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