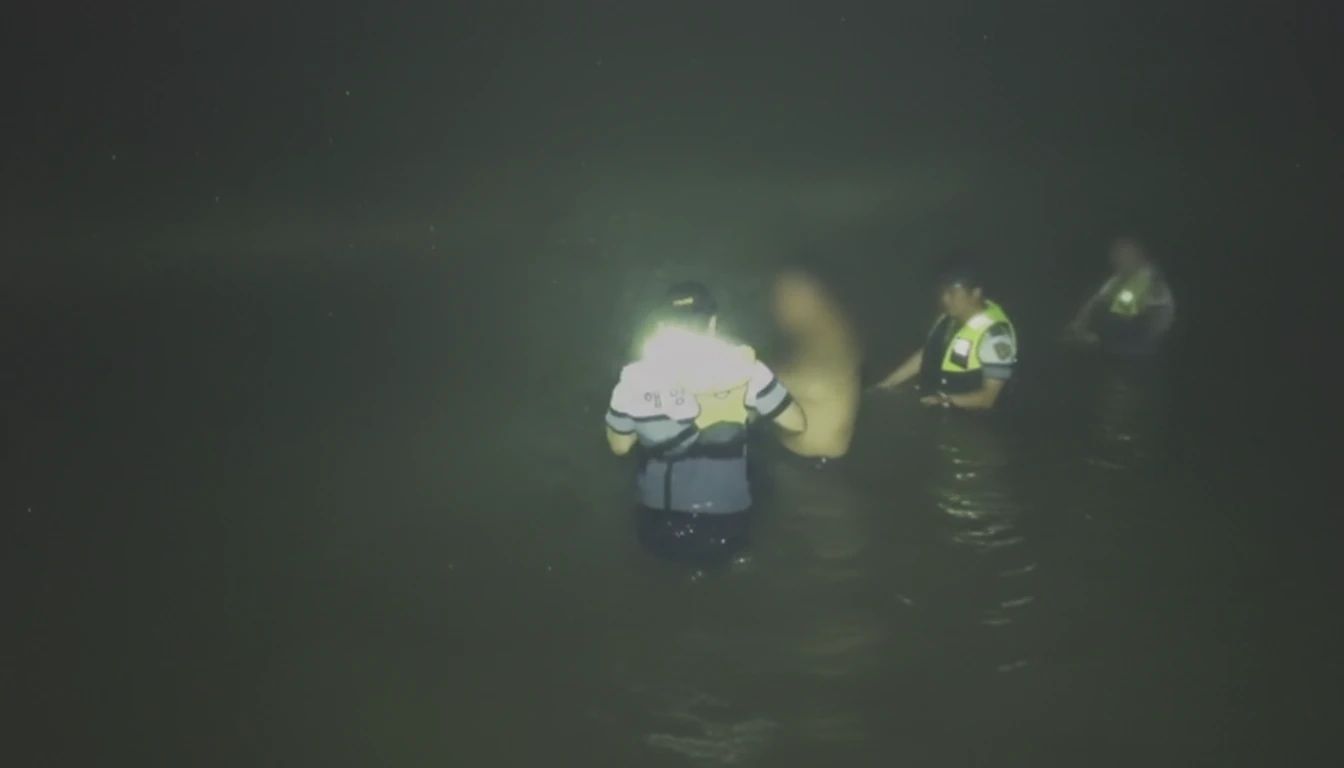금년 상반기 동안 육아휴직을 허용받지 못했다는 접수가 작년 1년간 전체 접수량을 상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소규모 업체일수록 이러한 위반행위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제도의 현실적 적용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14일 국회 환노위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부에서 제공받은 통계에 의하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육아휴직 미제공 관련 접수 건수가 184건에 달했다. 이는 2024년 연간 접수된 180건을 벌써 초과한 수치로, 최근 수년간 지속적인 증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131건에서 시작해 2021년 99건으로 잠시 감소했으나, 2022년 135건, 2023년 182건으로 다시 상승세를 보였다.
실제 법령 위반으로 판명된 사례는 상반기에만 20건이며, 이 가운데 2건이 기소 처분을 받았다. 과거 5년간 연간 위반 건수가 18건에서 27건 사이를 기록해온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절반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미 예년 수준에 근접한 상황이다.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대우 접수 역시 상반기 63건으로, 작년 총 112건의 56.3%에 해당하는 수준까지 증가했다. 모성보호 관련 전체 제도 위반 접수도 상반기 381건으로 작년 전체 491건의 77.6%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업체 규모별 분석 결과, 위반행위는 영세업체에 집중되는 현상이 뚜렷했다.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파악된 모성보호 제도 위반 2,242건 중 700건(31.2%)이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으며, 30인 미만으로 범위를 넓히면 1,160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반대로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388건에 그쳤다.
고용 지속률에서도 사업장 규모에 따른 격차가 명확히 나타났다. 올해 5월 기준 육아휴직 완료 1년 후 고용 지속률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70.1%에 머물렀지만, 50~300인 미만 79.6%, 300~1,000인 미만 85.8%, 1,000인 이상 90.8%로 규모가 클수록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대기업과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구분했을 때도 각각 89.8%와 72%로 상당한 차이를 나타냈다.
성별간 격차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0.5%포인트에 불과했던 남녀 고용지속률 차이가 올해 5월 기준 3.4%포인트로 벌어졌다. 출산휴가 후 고용지속률 역시 여성의 경우 50인 미만에서 79.8%, 1,000인 이상에서 94.5%를 기록해 큰 차이를 보였다.
남성 근로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77.8%였으나 1,000인 이상에서는 94.9%로 17.1%포인트 차이를 나타냈다. 특히 이는 2021년 3.7%포인트였던 격차가 4년 만에 5배 가까이 확대된 것이다.
김위상 의원은 "제도 확대만큼 현장에서의 실질적 작동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 등 모성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관리·지원 체계를 보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