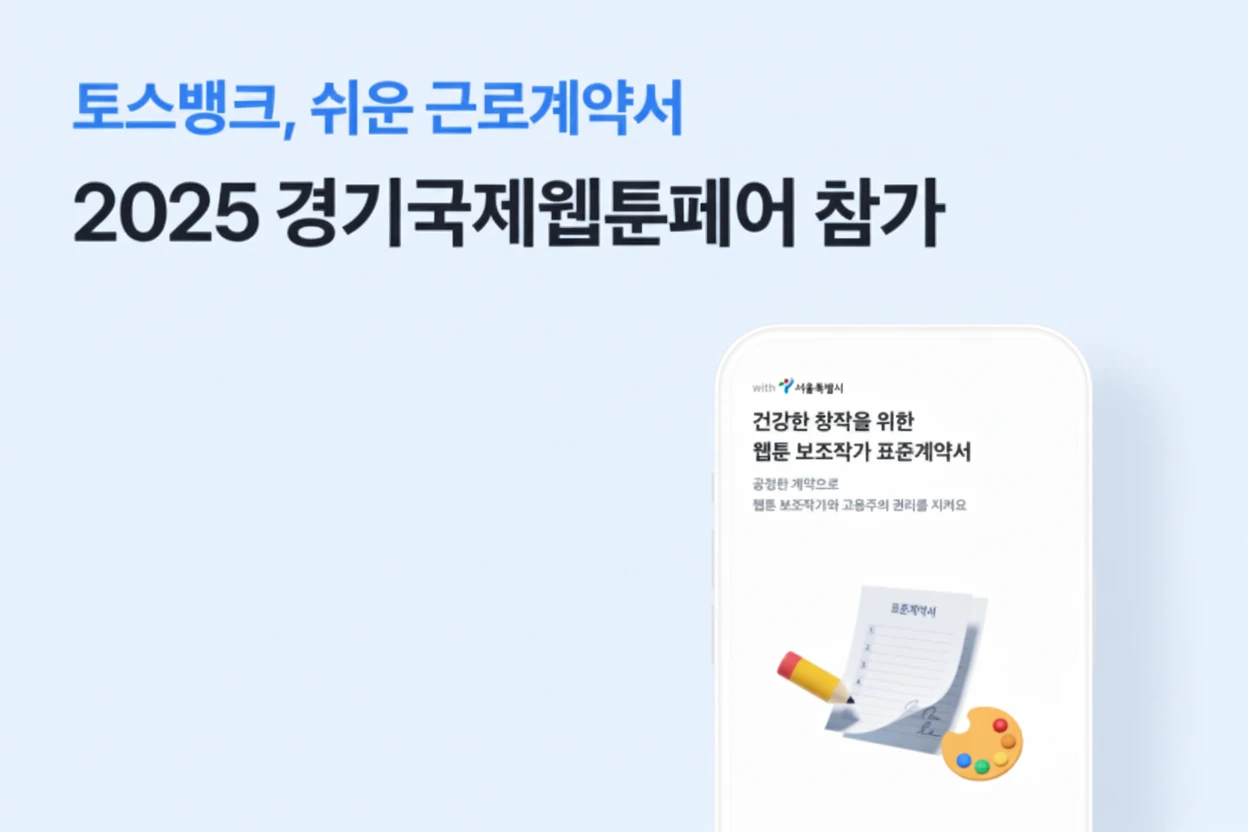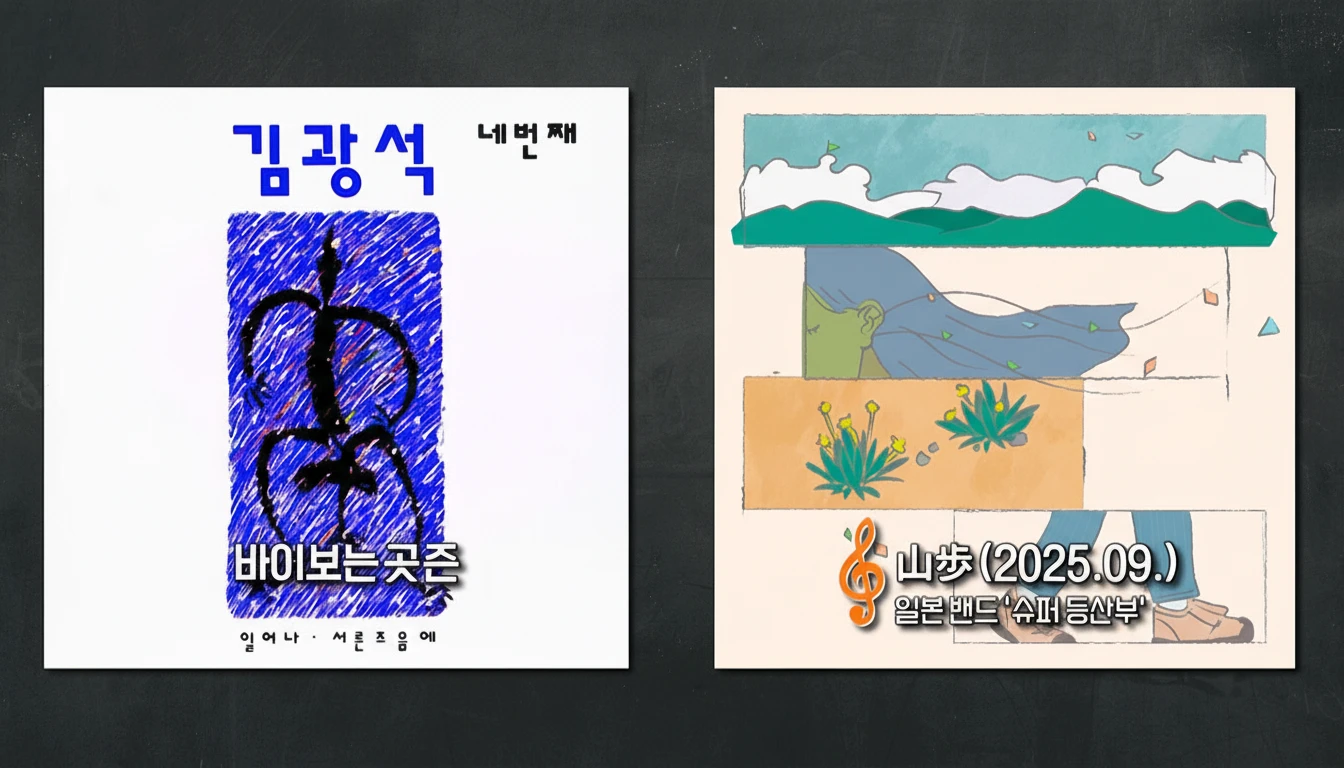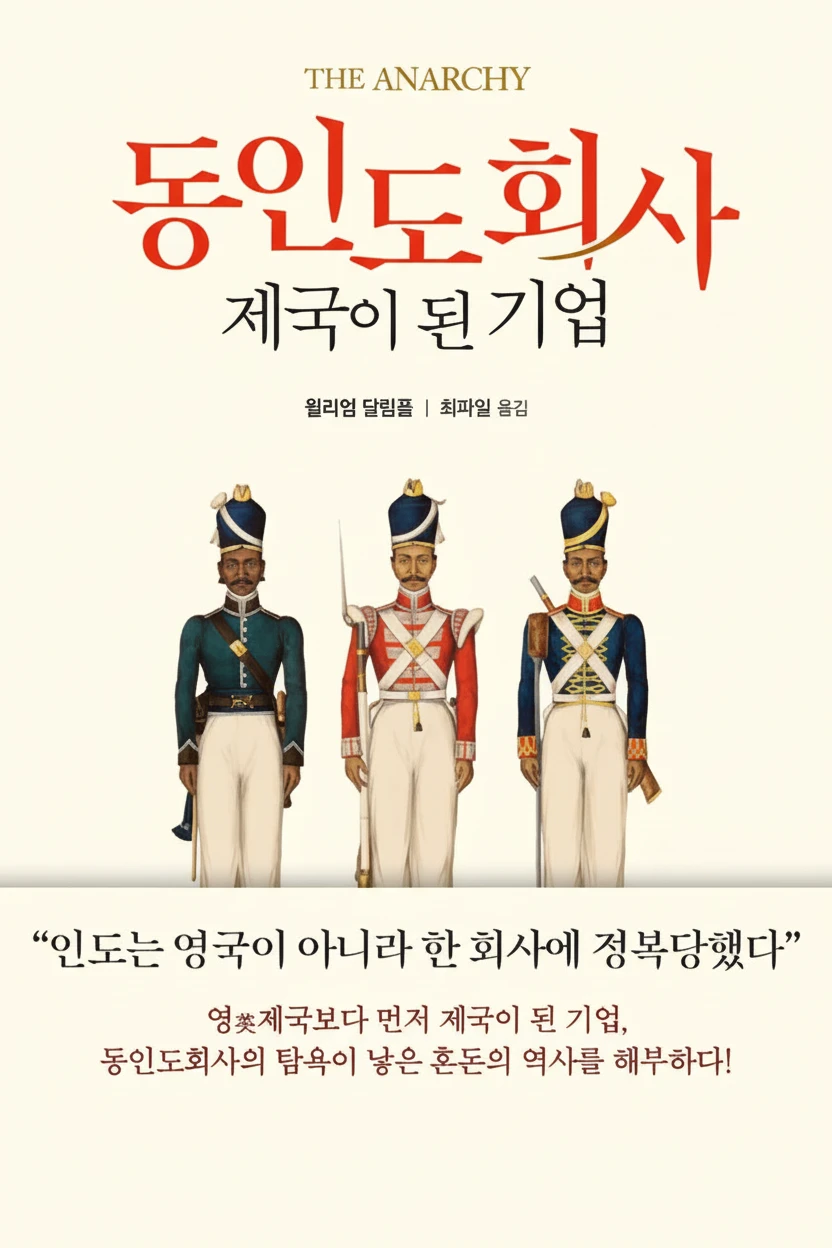
1765년 8월, 무굴제국의 젊은 황제 샤 알람이 영국의 한 상업회사와 굴욕적인 조약을 체결했다. 260만 루피라는 비교적 적은 대가로 세금 징수권까지 넘긴 알라하바드 조약의 상대방은 바로 동인도회사였다. 이 순간 세계사상 최악의 '기업 폭력'이 본격 시작됐다.
영국 역사저술가 윌리엄 달림플이 쓴 『동인도회사, 제국이 된 기업』은 1600년 설립된 한 무역상사가 어떻게 거대한 무굴제국을 무너뜨리고 인도 아대륙 전체의 지배자가 됐는지를 치밀하게 추적한 역작이다. 런던 영국도서관과 뉴델리 국립문서고의 방대한 사료를 바탕으로, 민간 영리기업이 제국을 집어삼킨 충격적 과정을 생생하게 재구성했다.
동인도회사는 처음부터 정복을 목적으로 세워진 조직이 아니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칙허장을 받아 동방 무역 독점권을 얻은 상인들의 연합체에 불과했다. 하지만 왕실의 특허와 의회의 비호가 결합하면서 회사는 점차 군사력을 키우고 세금을 징수하는 준국가 권력을 갖게 됐다. 특히 회사 설립 허가서에 담긴 모호한 표현들은 미래에 주권 행사, 화폐 주조, 입법·행정·사법권, 심지어 독자적 군대 보유까지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가 되었다.
전환점은 1707년 무굴제국 아우랑제브 황제의 사망이었다. 제국은 지방 분열과 반란으로 쇠퇴하기 시작했고, 마라타·벵골·아와드·마이소르 등 지역 군벌들의 독립 왕국이 곳곳에 등장했다. 이런 무정부 상태는 동방 무역 확대를 꿈꾸던 동인도회사에게 절호의 기회였다.
회사는 이 혼란을 무력으로 파고들었다. 군대를 조직하고 대포와 함선을 갖춘 전쟁 수행 기업으로 변모한 것이다. 병력의 대부분은 인도 현지에서 고용한 '세포이' 용병들이었다. 1757년 플라시 전투에서 벵골과 프랑스 동인도회사를 상대로 첫 승리를 거둔 뒤, 끝없는 약탈의 시대가 열렸다.
결정적인 승부수는 1764년 북사르 전투였다. 동인도회사는 무굴 황제와 여러 인도 왕조의 연합군을 격파하며 동부 해안과 벵골 지배권을 확고히 했다. 패전한 황제는 인도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의 '디와니'(세금 징수권)를 굴욕적으로 회사에 넘겨야 했다. 이후 회사는 행정·입법·사법권까지 행사하며 사실상 국가로 행세했다.
하지만 통치의 유일한 기준과 목적은 주주 이익 극대화였다. 주식회사 구조상 인도 주민들의 삶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1769년부터 4년간 벵골에서 벌어진 대기근은 이런 착취적 정책의 참혹한 결과였다. 인구의 3분의 1인 1000만 명이 굶어 죽는 와중에도 회사는 곡물 가격 안정이나 세금 감면 대신 주가 상승에만 몰두했다.
동인도회사의 몰락은 바로 그 탐욕에서 시작됐다. 부와 권력을 축적한 벼락 출세자들은 돈으로 의원과 의석을 사들이며 정경유착의 표본을 보여줬다. 벵골 대기근으로 토지 세입이 급감하자 거품이 꺼졌고, 회사는 현재 가치로 수억 파운드의 부채를 떠안게 됐다. 1813년 의회는 회사의 무역 독점권을 폐지했고, 1857년 세포이 항쟁을 거쳐 1874년 조용히 문을 닫았다.
저자는 이 역사를 단순한 과거사로 두지 않는다. 데이터와 기술력으로 세계 질서에 개입하는 현대 빅테크 기업들과 18세기 동인도회사의 놀라운 유사점을 지적한다. 웬만한 국가의 GDP를 뛰어넘는 시가총액, 충분히 규제받지 않는 권력 구조는 과거와 닮았다는 것이다. "동인도회사는 오늘날 기업 권력의 오남용 가능성에 관한 역사상 가장 섬뜩한 경고로 남아 있다"는 그의 결론은 4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현재적이다.